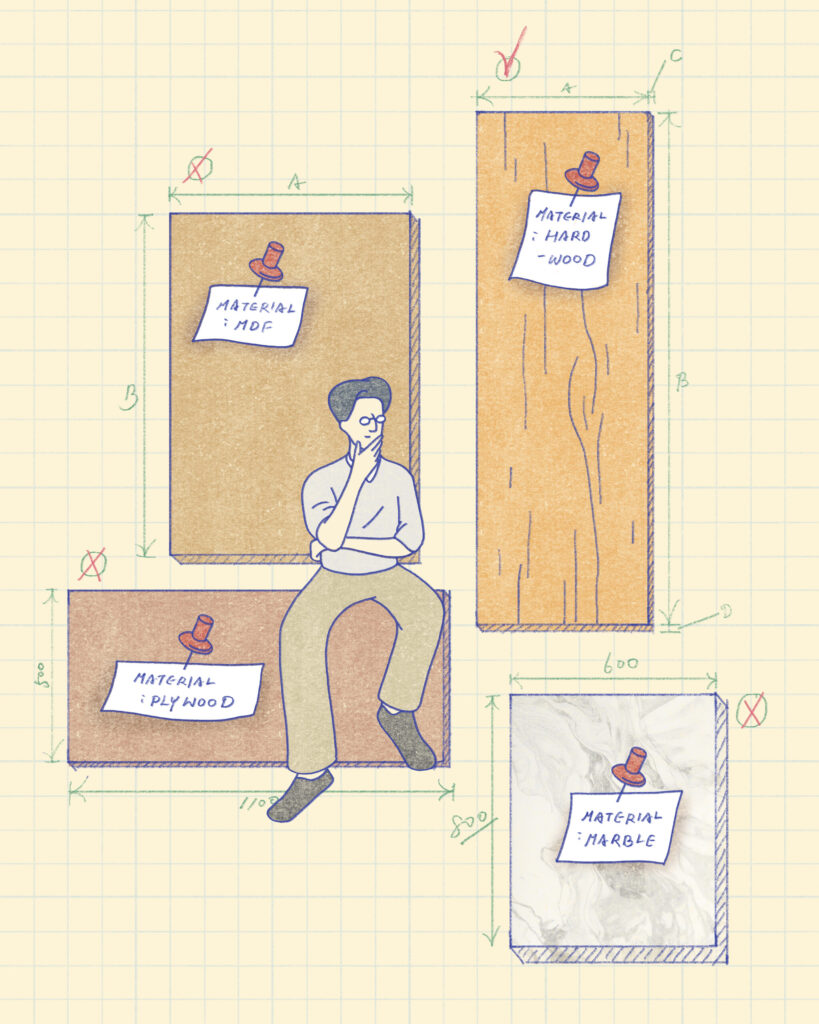about. 디퍼 칼럼
디퍼 칼럼은 필진마다 3회 차에 걸쳐 하나의 주제를 풀어가는 연재물이며, 책상에서의 몰입을 통해 성장한 인물들이 배움, 창작, 일 등에 대한 심층적인 사유와 정보를 전합니다. 새로운 지식이 뇌를 자극할 때, 기분 좋은 깨우침이 일어날 거예요.
책상 체험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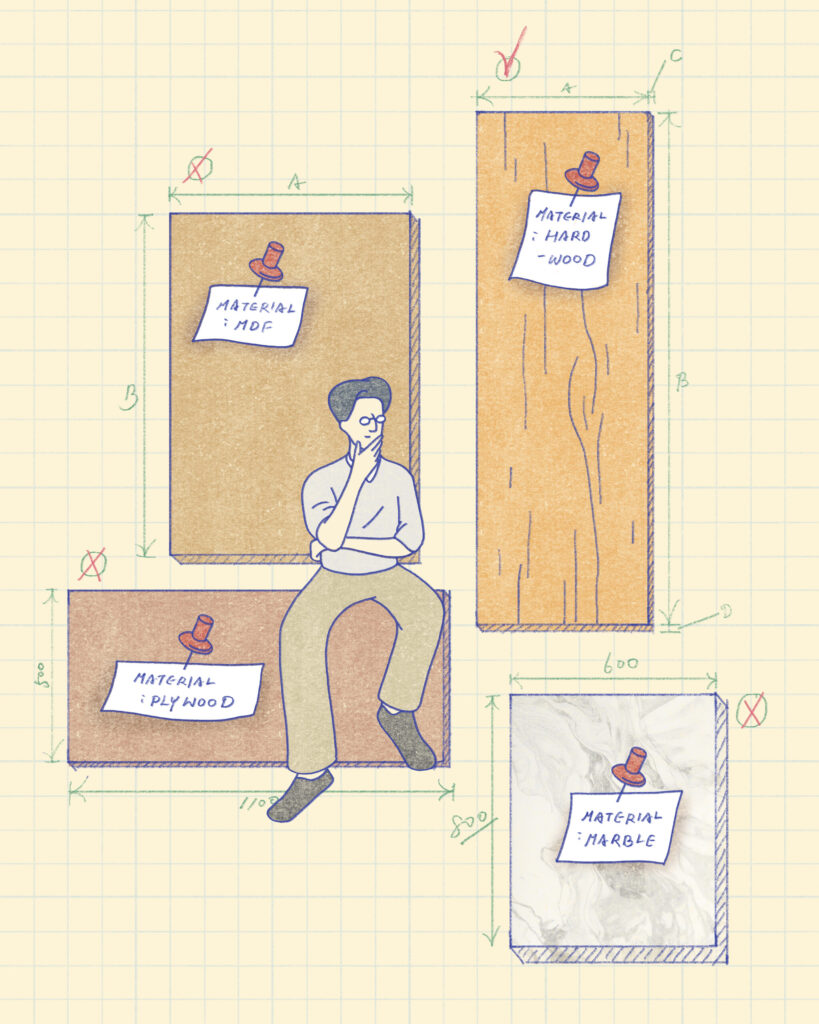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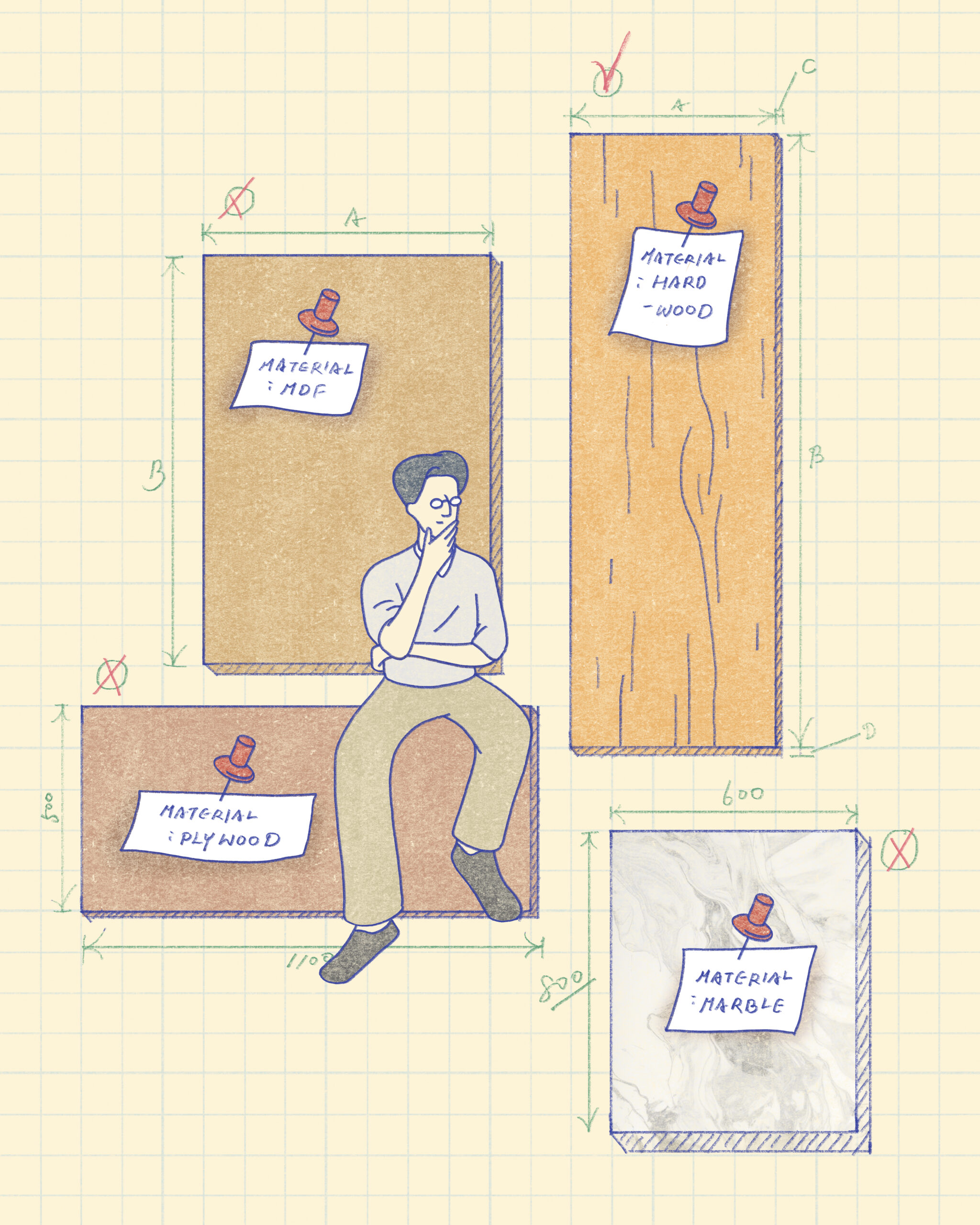
about. 디퍼 칼럼
디퍼 칼럼은 필진마다 3회 차에 걸쳐 하나의 주제를 풀어가는 연재물이며, 책상에서의 몰입을 통해 성장한 인물들이 배움, 창작, 일 등에 대한 심층적인 사유와 정보를 전합니다. 새로운 지식이 뇌를 자극할 때, 기분 좋은 깨우침이 일어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