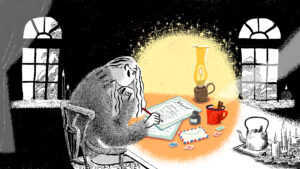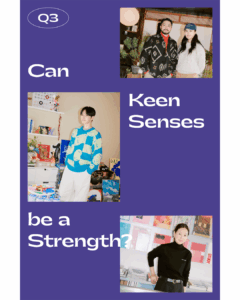서울의 친척들을 방문하던 어린 시절부터 그는 종로와 을지로 일대의 풍경을 좋아했다. 유리로 외벽을 두르는 커튼월 시공이 서울 번화가에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다. 페인트나 타일로 마감한 건물들은 한 채 한 채 색이 모두 달랐다. 세로로 길쭉하거나 원형으로 점점이 박힌 창문들도 각각의 건물마다 독특한 패턴을 만들었다. 소년은 생각했다. 신기하기도 해라. 사람 나이로 치면 환갑이 넘은 빌딩이 어떻게 저렇게 세련되었을까? 서울의 모던에 매혹된 그는 결국 대학과 대학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대학에 진학하며 도시 산책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건물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스마트폰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였고요.” 김영준은 10년째 도시의 빌딩을 디깅하고 있다. 1920년에서 1980년 사이에 지어진 옛 건물들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발견하고, 그 발견의 풍경에 ‘서울의 현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SNS 계정 ‘서울의 현대를 찾아서’에 쌓인 기록들은 2권의 독립출판물에 이어 〈서울〉이라는 이름의 단행본으로 곧 발행될 예정이다. “건물을 관찰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만의 아카이브를 만들고 싶었지요. 기록을 하다 보니 내가 그 건물의 영정사진을 남기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유명 건축가가 지었거나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건물은 다양한 자료로 남지만, 일상에서 마주하는 건물 대다수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 10년 동안 그가 기록한 건물들 중에는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질 예정인 것들이 많다. 김영준이 디깅한 건물의 기록은 결국 도시의 역사에 대한 아카이브가 된다. “화재에 취약하거나 휠체어 접근성이 낮은 등 옛 건물들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무작정 없애는 게 답은 아닐 거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서울의 역사가 단절되니까요.”
김영준은 오래된 건물의 가치를 재평가해 리모델링을 하거나 사라지기 전 투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기록으로라도 남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멸종 위기 동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땐 이미 개체수가 몇 남지 않았을 때잖아요. 위기에 처하기 전부터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요.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근현대 건축을 찾아보고 소셜미디어에 기록을 남기는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건물의 생명력도 길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건축을 디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우리의 관심을 통해 건물의 보다 긴 이용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운동화 끈을 매고 도시 건축 디깅에 나서기 전,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옛 건물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은 어떻게 기록해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