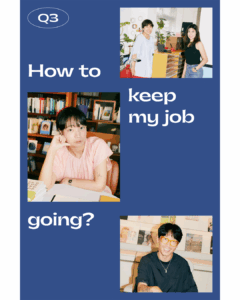책 <우리는 중독을 사랑해>는 자전적인 이야기이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모두 제 이불 속에서 나온 콘텐츠들이죠. 저는 이걸 ‘디지털 이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알고리즘의 세계에 파묻혀 안락하게, 정신없이 유영하는 시간들을 돌아보며 낸 책이에요. 저처럼 디지털 이불 속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제 또래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도 요즘엔 TV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쇼츠, 돋보기 탭에 있는 자기 계발서 같은 내용이나 ‘생활 꿀팁’ 콘텐츠를 보면서 저에게 DM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도파민을 좇아 콘텐츠를 소비하는 일이 왜 위험한 걸까요?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에는 기승전결이 없고 주로 ‘결론’만 있어요.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 가는, 혹은 스스로 빼앗기게 놔두는 자극적인 서사들이 주를 이루죠. 그럴수록 다양한 생각의 방식을 잃게 되고 ‘밈’에 의탁한 사고방식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군가 공인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빨리 ‘디지털 화형대’에 올려서 조리돌림을 하고 사과문을 얻어내려는 마음이 대표적이죠. 요즘 유행하는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출연자들을 깔보고 조롱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두고 이러쿵저러쿵하는 댓글들을 보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면 ‘나 요즘 이상한데?’ 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양한 삶의 서사를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명절마다 스몰 토크랍시고 “너는 언제 취업하니?”, “언제 결혼하니?”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어른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가장 중독되기 쉬운 건 뭐라고 생각하나요?
‘좋아요’가 대표적이죠. 조회 수, 좋아요 개수 등 눈에 보이는 수치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디지털 평판은 눈에 보이기 쉬운 이미지적 삶을 중심으로 굴러가요. 하지만 생각보다 ‘좋아요’나 팔로어가 많지 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훨씬 흥미로운 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자주 경험해요. ‘좋아요’를 많이 회수할 수 없는 성정의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들이 아주 중요한데 많이 가려져 있어요.

실제로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 디지털 세계에 몰입하게 된다는 악순환도 있죠.
소위 말하는 ‘문화 자본’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손쉬운 중독에 빠지죠. 가난하면 불량 식품을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듯,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게 되니까요. 문화자본이 있더라도, 긴 노동 시간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여유가 소진되면 도파민 중독이 되기 쉽죠.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사주나 타로 콘텐츠가 내려주는 ‘인생 스포일러’를 통해 제 인생의 불안을 누그러뜨리거나,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대신 ‘심리 궁예’를 해주는 심리학 콘텐츠를 보게 되더라고요.
‘디지털 디톡스’, ‘도파민 디톡스’가 유행하지만, 그 끝은 늘 ‘인증샷’이라는 것에 문제의식도 느껴요.
디톡스도 하나의 상품이 돼버렸죠. 요새 유행하는 책들에서 말하는 ‘디톡스’를 살펴보면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고즈넉한 산사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이 겹쳐져요. 그만큼의 물리적∙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죠. 심지어 디톡스 챌린지 혹은 모임 같은 것도 생겨났어요. 돈을 내고 디톡스를 사는 게 유행처럼 돼버렸죠. 마치 지금 탕후루 같은 디저트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끄는 한편, ‘제로 칼로리’에 집착하는 현상이 있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요. 도파민을 자극하는 콘텐츠들이 넘쳐나면서 디톡스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끄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지적으로 ‘예쁜’ 디톡스만 부각됐다고 느껴요. 어찌 보면 디톡스 과정은 정말 매끄럽지 않고 못생겼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새로운 디톡스를 상상해야 할 때예요.
새로운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거창하고 완벽한 디톡스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중독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고립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 이야기하며 나 스스로에게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을 찾는다고 가정할때 대체로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성공’을 한 사람들을 떠올리기 쉬운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은 기존의 나를 동어반복하게 만드는 만남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진정 만나야 하는 타자는 그 사회적 성공과 먼 존재들이에요. 물론 그 만남은 시혜적이지 않은, 불편하거나 귀찮을 수 있는 ‘평등’의 관점이 있어야 해요. 기존의 나를 확장시키는 만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