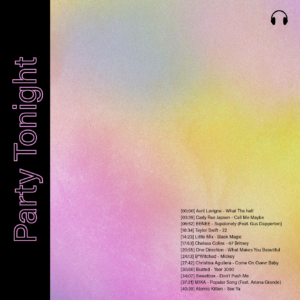연차가 쌓일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나의 욕심과 주변의 기대감도 점점 커진다. 기대에 부응하는 완벽한 인간이 되고자 내가 갖지 못한 능력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다. 하지만 그 노력이 언제나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잘 해내야 한다’는 욕심이 불안을 만들어 더 달릴 수 있는 힘을 잃게 할 수도 있다. 김혜원 에디터는 2년 전 팀장으로 승진해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팀장은 무엇이든 잘 알고, 언제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죠. 그런데 회사 밖의 저는 허술한 면이 있는 사람이니까 느슨해지고 싶다는 갈증이 컸어요.”
작년부터 시작한 달리기 모임에서 그는 해방감을 느꼈다. 거기서는 자신이 초보여도 괜찮았다. 잘 달리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자아를 전환하면 숨통이 트여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자아를 적시 적소에 온/오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나 서운함이 쌓이지 않고, 스스로가 꽤 좋아져요.” 그에게 있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을 많이 하고, 많이 받는 것. 그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일도 포함돼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일상 속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섬세하게 관찰하며 작은 기쁨을 부지런히 그러모은다.
그는 스스로를 ‘기록 광인’이라 부를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기록한다. “기록은 나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기록하지 않으면 세세한 생각과 감정들이 하나의 뭉툭한 덩어리로만 기억될 테니까요.” 그는 스무 살 때부터 매일 일기를 썼다. “잊혔으면 하는 일은 제외하고 되도록 좋은 것만 남겨요.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편집하는 거죠.”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로 일기장에 ‘작은 기쁨’이라는 연재 코너도 마련했다. 그날 인상적인 것을 가볍게 단어로 적으면 하루의 기념품이 된다. 아무것도 쓰고 싶지 않거나 쓸 말이 없는 것은 우울하다는 위험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