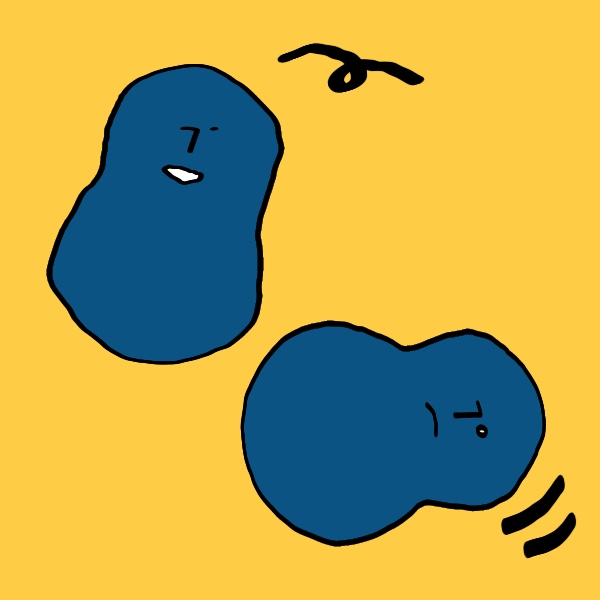새를 보는 일은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혼자만의 호젓한 시간을 갖게 하고, 삶을 견딜 새로운 힘을 준다. 꼭 철새를 보러 강화도에 가거나, 망원 렌즈를 챙겨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금 소개할 버드 와칭 툴키트만 있으면 쉴 틈 없는 일상에도 새 볼 틈이 생긴다.

새를 좋아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내가 새를 만나는 법〉을 쓴 방윤희 작가는 일러스트 전업 작가로, 새 보기를 즐기기 전에는 마땅한 취미 없이 심심한 일상을 보냈다. 큰마음 먹고 여행을 떠날 시간도 여력도 없던 그는 동네 개천 길을 걸었고, 자연스레 새 보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 그는 새 보는 일을 통해 거창한 목표나 기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사실이 큰 안도감을 주었다. 이를테면 새를 발견하는 즐거움, 새들의 행동과 소리, 생김새를 기억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면서 새들과 가까워지는 기분, 나아가 너무나 익숙해 미처 몰랐던 자연의 품에 기대어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행복감 같은 것 말이다.

새보기가 즐거워 가실 때에는
탐조라고 하면 먼저 쌍안경이나 망원 렌즈가 부착된 카메라를 들고 인적 없는 곳에서 새를 관찰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그도 도감을 샀던 그해, 남편에게 생일 선물로 작은 쌍안경을 받았다. 하지만 생각만큼 멀리 보이지 않는 데다 보다 보면 멀미가 났다. 야외에서 새를 관찰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배율과 구경의 쌍안경인 탓이었다. 그는 쌍안경을 다시 상자에 집어넣고, 가볍게 보는 쪽을 선택했다. 탐조라는 단어보다 ‘새를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는 새를 찾으러 멀리 가지도 않는다. 야생 조류를 관찰하는 탐조인들이 몰리는 곳(강서습지생태공원, 서울어린이대공원, 중랑천,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여의도공원 등)보다는 사는 동네, 내 집 테라스에서 만날 수 있는 새를 찾아보자는 주의다. 그는 창가에 작은 해바라기씨를 담은 모이통을 설치하고 나서 새들의 명확한 습성을 알게 되었다. 일 년 내내 꾸준히 해바라기씨를 먹으러 와주는 동고비(텃새. 몸의 윗면은 회색빛, 배는 노란색을 띤다)는 한 번에 2개씩 물고 날아가고, 쇠박새(박새과. 머리가 검고 뺨은 희다)는 하나를 물고 근처 나뭇가지에서 먹지만 참새들은 아예 창틀에서 눌러앉아 먹는 습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생활 반경과 공간 안에서 새들과 관계를 꾸준히 이어 나가며 자연스레 깨달은 새들의 모습이었다.
방윤희 작가는 관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새를 보면 금세 재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조언한다.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새를 바라보고 즐겨야 하는 이유다. 이쯤 되면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새를 관찰하고, 인간이 신세를 지고 있는 자연을 돌보는 일이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이제야말로 잔잔한 매일을 꾸준히 반복해 새가 한 자리 차지하는 삶을 만들어볼 차례다.

Interviewee 방윤희
자연을 사랑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새를 좋아하게 되면서 그림 그리는 게 즐거워졌고 새를 둘러싼 자연에 관심이 깊어졌다. 평범한 사람의 시선이 담긴 새 관찰기 〈내가 새를 만나는 법〉,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도감 〈사라지지 말아요〉를 썼다.
- EditorLee Anna
- DesignerNam Chansei
초보를 위한 일상탐조 안내서
초보 버더(새 보는 사람)가 동네를 산책하며 일상 탐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안내서입니다. 탐조 기본 수칙을 배우고, 새 관찰담을 그리고 기록할 수 있는 탐조 일지를 채워보면서 내 안에 새가 한자리 차지하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Related Category